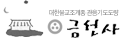황금성게임종류 ㅷ 바다이야기 ㅷ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소채린 작성일25-10-27 14:23 조회37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76.rcu914.top
15회 연결
http://76.rcu914.top
15회 연결
-
 http://7.rxc898.top
15회 연결
http://7.rxc898.top
15회 연결
본문
오리지널황금성3게임 ㅷ 블랙잭하는법 ㅷ↓ 96.rqc718.top ◑장마철이 지나고 폭염이 시작될 때 풀은 무섭게 자란다.
“풀은 못 이겨.”
마을 최고령 어르신은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동네에서 태어나 90평생 농사를 지어온 그의 말에 어떤 위엄 같은 게 느껴졌다. ‘풀을 얕잡아 보지 말라’는 조언일까, 아니면 ‘풀도 농사의 일부’라는 달관일까?
농사의 절반은 풀 관리
5도 2촌 하면서 풀에 얽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농사의 절반은 풀 관리”라거나 “풀이 곡식이라면 농민들 다 부자가 됐을 것”이라 했다. 장마가 지나고 불볕더위가 내리쬐는 요즘 같을 때는 풀이 자라는 환청이 ‘서걱서걱’ 들릴 정도다. “앞을 베고 뒤돌아보면 풀이 다시 수북이 올라와 있다”는릴게임 추천 사이트
농민의 말이 과장만은 아니다.
농사를 시작할 때 풀을 몰랐고, 그만큼 쉽게 생각했다. 농지를 놀리면 행정처분 한다는 공주 시청의 경고장을 받은 뒤,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풀을 베러 갔다. 가는 길에 면 소재지 철물점에서 낫 두 자루를 샀다. 늦봄의 더운 날, 해묵은 밭에는 묵은 풀, 새 풀이 얽혀 허벅지 높이까지 올라와 있었다. 아내와 무료황금성게임
나는 “어디서부터 벨까?” 하다 길과 접하는 초입부터 깎기 시작했다. 허리를 숙이고 부지런히 손을 놀렸다. 하지만 풀은 억세고 촘촘했다. 머리에서 목으로 땀이 줄줄 흘렀지만 한 시간 남짓에 겨우 한 평이나 정리했을 뿐이었다.
꽃 나무 아래 같이 예초기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의간접투자상품
풀관리는 아내의 몫이다.
우리 밭은 마을 가운데 봉긋이 솟은 능선에 있어 무얼 해도 쉽게 눈에 띈다. 이날도 100m쯤 떨어진 마을회관 정자나무 아래 주민 몇 분이 우릴 계속 보고 계셨다. 서툰 낫질을 하고 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우리 쪽으로 오셨다. “자네들 뭐하나?”,제일기획주가
“예, 풀 베고 곡식 심으려고요”, “그 낫으로 이 밭을 정리하겠다고? 그만하고 저리 가서 우리랑 얘기나 하세.” 정자나무로 가니 드시던 수박을 나눠줬다. 어르신들이 한마디씩 했다. “낫으로는 우리도 못해. 자네들 그러다 쓰러져.”
풀 베는 남편의 ‘메스컬리니티’
몇 주 뒤 다시 밭으로 갔다. 이번에는 예초기라는 무기와온라인 릴게임 손오공
함께였다. 아내는 인터넷을 뒤져 싸게 파는 곳을 알아냈는데, 우리가 결국 산 기계는 브랜드명도 불명확한 중국산이었다. 어쨌든 시동을 걸고 풀을 깎는데 예초기 날이 칼처럼 날카로운 데다 빠르게 회전해 무척 위협적이었다. 실재 농촌에서는 예초기 날에 돌이 튀거나, 미끄러지면서 날이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크게 다치는 일이 많다. 한 번 사용해 보고 나서 “이건 아니다” 싶어 단단한 플라스틱 줄로 된 날로 바꾸었다. 쇠 날처럼 손가락 굵기의 나무까지 쳐내지는 못해도, 웬만큼 웃자란 풀도 날리는 힘은 있었다.
엔진 힘으로 돌아가는 예초기는 확실히 능률적이었다. 낫으로는 종일 깎을 곳을 한두 시간에 정리할 수 있었다. 예초기를 지고 좌우로 흔들며 나가면 풀이 잘리며 길이 났다. 아내는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곤 했다. 영화에서 무림의 고수가 좌우의 오합지졸을 베어가는 게 연상된다 했다. 아내가 의외의 대목에서 남편의 ‘메스컬리니티’(masculinity 남자다움)를 느끼는 게 속으로 우스웠다.
하지만 예초기 돌리는 일도 쉬운 게 아니었다. 거세게 돌아가는 엔진의 진동이 어깨를 거쳐 몸으로 전달됐고, 제멋대로 튀어나가려는 작업봉을 누르며 풀을 깎노라면 금방 팔이 얼얼해졌다. 아침부터 시작해 오후까지 예초기를 돌린 날이면 어깨가 빠지듯 아팠고 가만있어도 몸이 덜덜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건 무리다 싶어 밭을 아랫단, 윗단, 농막 놓인 마당으로 나눠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깎는 자칭 ‘삼포제’를 실행해 보기도 했다. 한 번에 무리하지 않는 건 좋으나 매주 예초기를 돌려야 했다.
풀을 깎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대비
민들레 영토의 낭만은 사라지고
5월 말에 처음 예초기를 돌리면 풀이 ‘한풀’ 꺾인다는 처서를 지나 한참 뒤인 9월 말까지 계속 풀을 깎아야 했다. 어쩌다 한 주라도 건너뛰고 밭에 오면 2주 전 작업의 말끔함은 온데간데없고 더벅머리처럼 풀이 자라 있었다. 풀 가운데 민들레는 특히 생명력과 번식력이 엄청났다. 예초기 날에 잘려도 뿌리 끄트머리만 땅에 박혀 있으면 다시 살아났고, ‘메두사’처럼 더 많은 줄기를 뻗어서 꽃을 피우고 홀씨를 날렸다. 농사를 짓기 전에는 민들레에 대해 낭만적인 느낌이 있었다. 90년대에는 ‘민들레영토’란 커피전문점이 좋아 일부러 찾아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 끈질긴 생명력이 이 땅의 민초를 닮았다”는 말이 그럴듯했다. 하지만 농사를 짓고 알았다. 민들레가 농민, 바로 그 민초를 애먹이는 풀이란 것을.
농촌이 고령화하면서 풀은 깎기보다는 제초제로 없애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예초기를 열심히 돌리고 있으면 마을 어른들이 지나가다 “뭐하러 힘들게 그러냐. ‘풀약’ 줘” 라고 말씀하신다. 실재 마을의 논밭 둑은 가을이 아닌데도 풀이 누렇게 죽어 있다. 제초제를 세계 친 곳은 봄부터 가을까지 어떤 풀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 해도 나 마저 제초제를 쓰고 싶지는 않았다. 제초제를 뿌리면 토양 속 유익한 미생물도 다 죽을 것 같았다. 대신 비닐 멀칭이나 제초매트까지 외면하지는 못했다. 그걸 쓰면서 풀 깎는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좀 찜찜했다. 태우지도 못할 비닐 쓰레기를 양산하는 것이어서다.
이런 작은 고집 덕분에 마을에선 “풀 잘 깎는 젊은이(?)”로 소문났지만, 그 대가는 벌써 2개째 산 예초기와 적지 않게 나가는 파스 값이었다.
# 이봉현의 농막일기는?
기자로 35년간 서울에서 일했습니다. 혼자 집중할 때 에너지를 얻는 편이어서, 텃밭과 정원이 있는 호젓한 공간을 꿈꿔왔습니다. 마침내 충남 공주의 산간마을 밭을 사 2018년 사과대추, 자두 등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2020년 봄부터는 농막을 들여놓고 금요일 밤에 내려가 주말 텃밭 농사를 짓고 옵니다. 5년간의 ‘5도2촌’ 생활에서 경험한 기쁨, 시행착오, 지역의 현실 등을 담아 격주로 독자를 만나려 합니다. 한겨레 로그인 콘텐츠 ‘오늘의 스페셜’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뉴스 페이지에서는 하이퍼링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소창에 아래 링크를 복사해 붙여넣어 읽을 수 있습니다.)
▶이봉현의 농막일기
https://www.hani.co.kr/arti/SERIES/3317
글·사진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bhlee@hani.co.kr
“풀은 못 이겨.”
마을 최고령 어르신은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동네에서 태어나 90평생 농사를 지어온 그의 말에 어떤 위엄 같은 게 느껴졌다. ‘풀을 얕잡아 보지 말라’는 조언일까, 아니면 ‘풀도 농사의 일부’라는 달관일까?
농사의 절반은 풀 관리
5도 2촌 하면서 풀에 얽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농사의 절반은 풀 관리”라거나 “풀이 곡식이라면 농민들 다 부자가 됐을 것”이라 했다. 장마가 지나고 불볕더위가 내리쬐는 요즘 같을 때는 풀이 자라는 환청이 ‘서걱서걱’ 들릴 정도다. “앞을 베고 뒤돌아보면 풀이 다시 수북이 올라와 있다”는릴게임 추천 사이트
농민의 말이 과장만은 아니다.
농사를 시작할 때 풀을 몰랐고, 그만큼 쉽게 생각했다. 농지를 놀리면 행정처분 한다는 공주 시청의 경고장을 받은 뒤,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풀을 베러 갔다. 가는 길에 면 소재지 철물점에서 낫 두 자루를 샀다. 늦봄의 더운 날, 해묵은 밭에는 묵은 풀, 새 풀이 얽혀 허벅지 높이까지 올라와 있었다. 아내와 무료황금성게임
나는 “어디서부터 벨까?” 하다 길과 접하는 초입부터 깎기 시작했다. 허리를 숙이고 부지런히 손을 놀렸다. 하지만 풀은 억세고 촘촘했다. 머리에서 목으로 땀이 줄줄 흘렀지만 한 시간 남짓에 겨우 한 평이나 정리했을 뿐이었다.
꽃 나무 아래 같이 예초기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의간접투자상품
풀관리는 아내의 몫이다.
우리 밭은 마을 가운데 봉긋이 솟은 능선에 있어 무얼 해도 쉽게 눈에 띈다. 이날도 100m쯤 떨어진 마을회관 정자나무 아래 주민 몇 분이 우릴 계속 보고 계셨다. 서툰 낫질을 하고 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우리 쪽으로 오셨다. “자네들 뭐하나?”,제일기획주가
“예, 풀 베고 곡식 심으려고요”, “그 낫으로 이 밭을 정리하겠다고? 그만하고 저리 가서 우리랑 얘기나 하세.” 정자나무로 가니 드시던 수박을 나눠줬다. 어르신들이 한마디씩 했다. “낫으로는 우리도 못해. 자네들 그러다 쓰러져.”
풀 베는 남편의 ‘메스컬리니티’
몇 주 뒤 다시 밭으로 갔다. 이번에는 예초기라는 무기와온라인 릴게임 손오공
함께였다. 아내는 인터넷을 뒤져 싸게 파는 곳을 알아냈는데, 우리가 결국 산 기계는 브랜드명도 불명확한 중국산이었다. 어쨌든 시동을 걸고 풀을 깎는데 예초기 날이 칼처럼 날카로운 데다 빠르게 회전해 무척 위협적이었다. 실재 농촌에서는 예초기 날에 돌이 튀거나, 미끄러지면서 날이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크게 다치는 일이 많다. 한 번 사용해 보고 나서 “이건 아니다” 싶어 단단한 플라스틱 줄로 된 날로 바꾸었다. 쇠 날처럼 손가락 굵기의 나무까지 쳐내지는 못해도, 웬만큼 웃자란 풀도 날리는 힘은 있었다.
엔진 힘으로 돌아가는 예초기는 확실히 능률적이었다. 낫으로는 종일 깎을 곳을 한두 시간에 정리할 수 있었다. 예초기를 지고 좌우로 흔들며 나가면 풀이 잘리며 길이 났다. 아내는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곤 했다. 영화에서 무림의 고수가 좌우의 오합지졸을 베어가는 게 연상된다 했다. 아내가 의외의 대목에서 남편의 ‘메스컬리니티’(masculinity 남자다움)를 느끼는 게 속으로 우스웠다.
하지만 예초기 돌리는 일도 쉬운 게 아니었다. 거세게 돌아가는 엔진의 진동이 어깨를 거쳐 몸으로 전달됐고, 제멋대로 튀어나가려는 작업봉을 누르며 풀을 깎노라면 금방 팔이 얼얼해졌다. 아침부터 시작해 오후까지 예초기를 돌린 날이면 어깨가 빠지듯 아팠고 가만있어도 몸이 덜덜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건 무리다 싶어 밭을 아랫단, 윗단, 농막 놓인 마당으로 나눠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깎는 자칭 ‘삼포제’를 실행해 보기도 했다. 한 번에 무리하지 않는 건 좋으나 매주 예초기를 돌려야 했다.
풀을 깎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대비
민들레 영토의 낭만은 사라지고
5월 말에 처음 예초기를 돌리면 풀이 ‘한풀’ 꺾인다는 처서를 지나 한참 뒤인 9월 말까지 계속 풀을 깎아야 했다. 어쩌다 한 주라도 건너뛰고 밭에 오면 2주 전 작업의 말끔함은 온데간데없고 더벅머리처럼 풀이 자라 있었다. 풀 가운데 민들레는 특히 생명력과 번식력이 엄청났다. 예초기 날에 잘려도 뿌리 끄트머리만 땅에 박혀 있으면 다시 살아났고, ‘메두사’처럼 더 많은 줄기를 뻗어서 꽃을 피우고 홀씨를 날렸다. 농사를 짓기 전에는 민들레에 대해 낭만적인 느낌이 있었다. 90년대에는 ‘민들레영토’란 커피전문점이 좋아 일부러 찾아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 끈질긴 생명력이 이 땅의 민초를 닮았다”는 말이 그럴듯했다. 하지만 농사를 짓고 알았다. 민들레가 농민, 바로 그 민초를 애먹이는 풀이란 것을.
농촌이 고령화하면서 풀은 깎기보다는 제초제로 없애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예초기를 열심히 돌리고 있으면 마을 어른들이 지나가다 “뭐하러 힘들게 그러냐. ‘풀약’ 줘” 라고 말씀하신다. 실재 마을의 논밭 둑은 가을이 아닌데도 풀이 누렇게 죽어 있다. 제초제를 세계 친 곳은 봄부터 가을까지 어떤 풀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 해도 나 마저 제초제를 쓰고 싶지는 않았다. 제초제를 뿌리면 토양 속 유익한 미생물도 다 죽을 것 같았다. 대신 비닐 멀칭이나 제초매트까지 외면하지는 못했다. 그걸 쓰면서 풀 깎는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좀 찜찜했다. 태우지도 못할 비닐 쓰레기를 양산하는 것이어서다.
이런 작은 고집 덕분에 마을에선 “풀 잘 깎는 젊은이(?)”로 소문났지만, 그 대가는 벌써 2개째 산 예초기와 적지 않게 나가는 파스 값이었다.
# 이봉현의 농막일기는?
기자로 35년간 서울에서 일했습니다. 혼자 집중할 때 에너지를 얻는 편이어서, 텃밭과 정원이 있는 호젓한 공간을 꿈꿔왔습니다. 마침내 충남 공주의 산간마을 밭을 사 2018년 사과대추, 자두 등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2020년 봄부터는 농막을 들여놓고 금요일 밤에 내려가 주말 텃밭 농사를 짓고 옵니다. 5년간의 ‘5도2촌’ 생활에서 경험한 기쁨, 시행착오, 지역의 현실 등을 담아 격주로 독자를 만나려 합니다. 한겨레 로그인 콘텐츠 ‘오늘의 스페셜’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뉴스 페이지에서는 하이퍼링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소창에 아래 링크를 복사해 붙여넣어 읽을 수 있습니다.)
▶이봉현의 농막일기
https://www.hani.co.kr/arti/SERIES/3317
글·사진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bhlee@hani.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