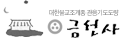다빈치릴게임다운로드 ♗ 51.rax781.top ♗ 빠칭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소채린 작성일25-11-08 05:51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99.rff458.top
0회 연결
http://99.rff458.top
0회 연결
-
 http://59.rge117.top
0회 연결
http://59.rge117.top
0회 연결
본문
【53.rax781.top】
바다이야기 다운로드야마토2체리마스터 다운신천지게임 다운로드
알라딘체험머니 무료 슬롯 메타 모바일야마토게임 게임바둑이추천 파칭코게임 황금성 게임 다운로드 바다이야기 pc용 황금성 오리지널 황금성하는곳 파칭코 어플 게임몰 릴게임 바다이야기 apk 슬롯종류 바다이야기 부활 야마토온라인주소 체리마스터 pc용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야마토 릴게임 온라인 슬롯머신 오션파다라이스 다운로드 빠찡코 하는 방법 인터넷황금성 용의눈게임 하이클래스릴게임 최신야마토 무료야마토 다빈치다운로드 야마토 게임방법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바다이야기 꽁머니 환전 야마토창공 릴게임 신천지 무료슬롯체험 모바일파칭코 프라그마틱 슬롯 추천 바다이야기규칙 릴게임다운 오리지널야마토2게임 릴게임손오공하는법 릴게임손오공 게임몰 인터넷야마토릴게임 빠친코게임 슬롯버그 릴게임사이트 프라그마틱 무료체험 야마토게임공략법 무료충전게임 바다이야기 슬롯 파칭코 게임 릴게임야마토 일본빠찡꼬 릴게임오션 없습니다. 바다이야기코드 릴게임 황금성 알라딘온라인릴게임 바다이야기 게임장 바다이야기 파일 우주전함야마토2202 고전릴게임 바다이야기2 바다이야기무료체험 야마토5게임공략법 신천지릴게임 릴게임 먹튀보증 릴짱 오션파라다이스게임하는법 바나나게임 신천지릴게임 스핀모바게임랜드 바다이야기게임다운 모바일파칭코 무료 슬롯 메타 온라인빠찡고 바다이야기게임기 강원랜드 슬롯머신 확률 공개 황금성9 프라그마틱 슬롯 추천 알라딘 게임 다운 슬롯머신 확률 바다이야기 무료 야마토5게임다운로드 777 잭팟 릴황 금성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체험 슬롯머신 종류 야마토5다운로드게임사이트 손오공게임온라인 빠칭코게임 릴게임추천 오션파라다이스 다운로드 빠찡코 하는 방법 모바일릴게임접속하기 무료 야마토 게임 체리 마스터 pc 용 야마토2게임동영상 사이다 릴게임 파칭코하는법 온라인백경게임 릴게임예시 종합릴게임 릴게임동영상 신오션파라다이스 야마토게임공략법 오리 지날황금성 다빈치릴게임다운로드 백경사이트 알라딘릴게임 사이트 바다이야기 5만 야마토2 pc버전 최신릴게임 신천지인터넷게임 황금성 무료머니 바다이야기 도박 릴게임검증 pc야마토게임 알라딘 게임 다운 야마토5다운로드게임사이트 프라그마틱 슬롯 조작 슬롯머신 기계 구입 슬롯버그 키지노릴게임 무료슬롯 릴게임다운 [잠수함토끼콜렉티브]
▲ 2025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 포스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5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열고, 인공지능 기술과 의료데이터가 주도할 산업 변화의 방향을 논의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난 11월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 새희망홀씨대출 금리 한 '빅데이터 포럼'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담당자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22대 국회 내 입법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2023)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2023)이 각각 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하다. 명칭은 '디지털헬스케어법'이지만, 실제 내용은 의료데이터의 수집·연계 기업은행 ·활용 구조에 관한 것이다. 정직하게 말하면 '디지털헬스케어 데이터법'이 더 정확하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발표 자료에는 네 가지 대표 서비스가 등장했다.
(1) 자녀 예방접종 알림,(2) 부모님 건강 모니터링,(3) 검증된 개인 건강정보 기반 진료,(4)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을 통한 약물 오남용·감염 관리.
금리인하 표면적으로는 국민 편익을 위한 첨단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의료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산업적 재활용 구조가 핵심이다.
즉, 의료데이터를 공익이 아닌 산업 활성화 수단으로 삼는 새로운 법률적 틀을 만들려는 시도다.
"Blue Button인가, Biobank인가"
정부 연차휴가규정 가 묘사하는 법안 마련 뒤의 모습은 정부가 사실 어떤 형태의 디지털헬스케어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하고 있는가를 최대한 모호하게 만들어 혼동을 일으킨다.
일견 '내 건강정보를 내가 확인·전송·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미국식 MyData(Blue Button) 모델처럼 들리지만, 행정 구조와 법 조항을 보면 유럽식 Biobank/Reposito 무직당일대출 ry 모델, 즉 국가가 수집한 데이터를 집중 관리하고 2차 활용하는 방식에 가깝다. MyData형은 개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강화하지만, 그만큼 민간 앱과 기업으로 데이터가 이전될 위험이 크다. 반대로 Biobank형은 공공 연구와 정책을 위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국가가 데이터를 통제하고 산업에 재이용할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의 Blue Button Initiative는 연방 보훈처(VA)에서 시작되어, 환자가 웹포털에 로그인한 뒤 실제로 'Blue Button'을 클릭하면 자신의 진료기록, 검사결과, 복약정보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데이터의 주체가 명확히 개인이며, 정부는 환자가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권리의 통로를 제공한다.
▲ 미국 '블루 버튼 이니셔티브'의 웹 게시용 로고 미국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블루 버튼(Blue Button)' 프로젝트는 환자가 자신의 의료정보를 직접 내려받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개인 건강데이터 접근 서비스다.
ⓒ 미국 보훈청
이 권리 기반 구조는 이후 FHIR API(국제 표준화된 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와 결합되며 민간 앱 생태계로 확산되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환자가 단 한 번의 '동의'만 하면, 의료데이터는 HIPAA(미국 의료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벗어나 민간 앱으로 이전될 수 있었다.
이 환경 속에서 Ciitizen, Apple Health, PicnicHealth 같은 기업들이 등장했다. 특히 Ciitizen은 창립자가 희귀질환으로 여동생을 잃은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개인적 동기에서 출발했다. 이 회사는 환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대신 환자가 동의한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임상시험 기업과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냈다. 실제로 Ciitizen(이후 유전체 기업 Invitae에 합병됨)은 환자 대신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하고, 이를 표준화된 전자 형식으로 정리해 개인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환자는 앱을 통해 자신의 데이터를 내려받거나 다른 병원에 전송할 수 있었고, Ciitizen은 이 과정을 대신 처리해주는 일종의 데이터 대리인으로 작동했다.
▲ Ciitizen의 설립 계기를 설명하는 슬라이드 "데이터에 목적을 부여하다" ? 애플에 인수된 의료데이터 스타트업 Gliimpse의 창업자였던 아닐 세스(Anil Sethi)는, 전이성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여동생 타니아를 기리기 위해 Ciitizen을 설립했다. * 출처: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501134/000119312521266044/d212880dex992.htm
ⓒ Invitae
▲ 과거 Ciitizen의 서비스 페이지 사용자는 병원별 진단 보고서, 조직검사 결과, 치료 이력 등 자신의 의료기록을 한눈에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사진은 타니아 세스의 유방암 조직검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실제 데이터 예시 화면. * 출처: https://www.outofpocket.health/p/ciitizen-and-the-patient-data-marketplace
ⓒ Out Of Pocket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데이터 마켓플레이스(health data marketplace)'라 불리는 새로운 데이터 브로커 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했다. Blue Button 정책과 FHIR 기반 API를 통해 확보된 환자 데이터가 병원, 보험사, 연구기관, 제약·바이오 기업 사이에서 거래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Datavant, TriNetX, HealthVerity 같은 플랫폼이다. 이들은 의료기관과 기업을 연결해 "표준화된 환자 데이터 세트"를 사고팔며, 제약사와 바이오테크 기업은 이를 분석해 임상시험 설계나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했다.
결국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열린 통로가 곧 '데이터 상업화'를 위한 시장으로 재편된 셈이다.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 데이터는 다시 시장을 순환하며 기업의 자산이 되어갔다.
한국의 디지털헬스케어법 역시 같은 구조를 품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전송요구권'을 개인에게 부여하지만, 동시에 '활용 전문기관'을 지정해 산업과 연구에 데이터를 개방할 근거를 만든다. 결국 지금은 공공 MyData 플랫폼(MyHealthway)이지만, 향후 API가 민간에 개방되면 한국판 유료 데이터 플랫폼이 출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AI 기반 건강 리포트", "개인 맞춤형 처방 추천", "예측형 건강지수" 같은 서비스를 내세워 개인 데이터를 분석·가공·판매하는 산업이 등장할 것이다. 이는 공공 인프라를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가 다시 시장의 상품으로 되돌아오는 구조다.
그러나 또 한편, 데이터의 양이 많다고 의료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임상적 근거 없이 "AI 기반 인사이트"를 내세우는 기업들은 이미 급증하고 있다. 요즘 쏟아져 나오는 디지털 멘탈헬스 앱들만 봐도 그렇다. 그들은 스마트폰 센서나 웨어러블 기기로 얻을 수 있는 피상적이고 산발적인 생체 데이터를, 가령 '우울'이나 '불안' 같은 복잡한 심리적 구성개념(construct)과 근거 없이 동일시한다. 그 위에 "AI 마음건강 관리" 같은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객관성과 과학성을 가장한 기만적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이런 환상은 결국 시장의 환멸을 불러오고, 마침내는 유일하게 남은 현실적인 사업모델인 보험료 차등, 위험군 선별, 소비자 등급화 같은 차별적 수익화 모델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반면, 유럽의 Biobank형 모델은 데이터를 공공 연구와 정책 목적으로 수집·보관하고 개인의 직접 통제보다는 제도적 통제를 중시한다. 복지부의 담론은 이 두 모델 사이를 끊임없이 왕복한다. 공식 자료에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문장과 "국가가 데이터를 통합해 산업과 연구에 활용한다"는 문장이 나란히 있다. 결국 데이터의 소유 주체가 국민인지 국가인지 불분명하다.
이는 국민에게는 '내 건강정보 보기'라는 권리의 언어를, 산업계에는 '데이터 개방과 활용'이라는 성장 언어를 동시에 전달하려는 전략적 양면성에서 비롯된 모호함일 것이다.
▲ 건강정보 고속도로: '환자 중심'으로 포장된 데이터 유통 인프라 '고속도로'라는 이름은 데이터 이동의 효율을 포장하지만, 그 위에서 누가 운전하고, 누가 요금을 받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 보건복지부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상의 기술적 한계
보건복지부가 슬라이드에서 제시한 "전국민 건강정보 고속도로(MyHealthway)"는 새로운 구상이 아니다. 이 사업은 이미 2021년부터 구축이 시작되어, 2024년 현재 모바일 앱 '나의건강기록'과 웹 포털(MyHealthway.go.kr)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은 금융인증서나 PASS 인증으로 로그인해① 공공기관 보유 정보(진료·투약·검진·예방접종 이력 등)와② 일부 참여 의료기관의 EMR 데이터를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또한 걸음수·혈압·혈당 등 개인 건강기기나 스마트폰 헬스앱(삼성헬스·애플헬스) 데이터도 연동 가능하다. 사용자는 이 데이터를 PDF로 저장하거나, 일시적 QR코드를 발급해 의료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의료기관 측은 환자가 앱에서 공유한 데이터를 웹뷰어나 EMR 내 '나의건강기록' 모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일부 시범병원에서만 작동하며, 열람 시간도 보안상 30분으로 제한된다. 현재까지는 환자 → 병원으로의 단방향 공유(PHR, Personal Health Record) 구조이며, 전국 병·의원 간의 실시간 연계나 예약 시스템 통합은 구현되어 있지 않다.
즉, 현재의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시민 개인의 데이터 열람·공유" 단계까지는 작동 중이지만,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전국 실시간 통합"이나 "AI 기반 의료연계 서비스"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 여러 병원의 진료 일정을 하나의 창구에서 예약하는 이탈리아 'CUP' 모델. 병원·전화·무인 단말 등 다양한 창구에서 예약 정보를 입력하면, 중앙화된 백오피스가 여러 병원의 진료 일정을 통합 관리한다. * 출처: https://kaizen.com/it/insights-it/migliorare-punto-nevralgico-servizio-sanitario/
ⓒ Kaizen Institute
<뚜벅뚜벅 이탈리아 공공의료: 피에몬테 에밀리아로마냐 의료견문록>(또하나의문화, 2019)에 문정주 선생이 기록한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보면 이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그곳에서는 시민이 가까운 우체국이나 은행 창구에 가서 대기가 가장 적은 병원을 예약할 수 있다. 이는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가 통합돼 있고, 예약·대기·검사 데이터가 표준화돼 실시간으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볼로냐·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은 1990년부터 30여 년에 걸쳐 CUP(Centro Unico di Prenotazione, 단일예약센터)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CUP은 지역 내 공공병원과 보건소, 약국, 콜센터, 웹포털을 하나의 예약 네트워크로 엮은 시스템이다.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거버넌스와 표준화였다. 우선 각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항목과 검사코드를 하나의 서비스 카탈로그로 통일하고, 예약·대기·결제 프로세스를 지역 표준으로 정비했다. 시민은 온라인, 병원 창구, 콜센터, 약국('FarmaCUP') 등 어느 채널을 이용하더라도 같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통합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지방보건국(ASL) 단위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지역 수준으로 확장되었고, 그 후에야 국가 차원의 대기열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연계됐다. 즉, 점진적이고 협의적인 확장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그럼에도 CUP은 여전히 모든 병원을 포괄하지 않는다. 주로 공공의료 네트워크 중심으로만 작동하며, 영상·유전체처럼 복잡한 데이터는 '예약' 기능 범위 밖에 있다.
즉, 현재의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전국 통합 EMR 네트워크가 아니라, 공공데이터와 일부 병원 정보를 개인 앱을 통해 확인·공유할 수 있는 제한적 플랫폼이다.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그 위에 "전국민 건강정보 고속도로"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덧씌우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MyHealthway의 기능을 '혁신'으로 재포장하는 셈이다.
한국이 이탈리아 같은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최소한 다섯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국가 차원의 서비스 카탈로그 표준, 둘째, 의료 제공자 디렉토리 구축, 셋째, 모든 EMR에 적용 가능한 강제 기술규격, 넷째, 이를 감독하고 유지할 전담 조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계적 지역 시범사업이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인천공항 한 곳에서 전 세계 항공사의 운항과 예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전국 통합 실시간 예약"을 말하는 것은, 기술적 현실을 무시한 행정적 선언에 가깝다.
법안 구조상, 민간 병원은 제외
안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2024.10.31)에 따르면, 데이터 제공 의무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복지부가 지정한 일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한정된다.
즉, 대다수 민간 병·의원은 데이터 개방 의무가 없다. 결국 정부는 "산업 진흥"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되, 실제 제공 의무와 책임은 공공기관과 국립대병원에 떠넘긴다. 공공은 책임만, 민간은 이익만 갖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예방접종 알림"은 이미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NIP)'은 이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서비스는 기존 기능의 재포장에 불과하다. 이런 반복은 단순한 행정 중복이 아니라, 디지털헬스케어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가능한 기능을 '혁신'처럼 포장하는 관료적 언어의 전략을 보여준다.
"부모님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의 돌봄 공백
복지부가 내세운 '부모님 건강상태 실시간 알림'은 기술적으로 가능해 보이지만, 그다음 단계 (위험 알림 이후의 돌봄과 대응)의 책임 구조가 없다. 공공의 간호 인프라나 커뮤니티 케어 체계 없이 가족에게 알림만 보내는 시스템은,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 전가하는 기술적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데이터만으로 환자 안전이 보장되진 않는다
'검증된 개인 건강정보 기반 진료'와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을 통한 약물 오남용·감염 관리'는 모두 어떤 건강·의료 문제를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효한 정보 결여', 혹은 '당사자의 무지'에 귀인하는 여러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회사들과 너무나 꼭같은 시각을 드러낸다. 즉, 권위 있는 전문 지식 혹은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제공하면 오판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사고방식이다.
가령, 섭식장애를 흥미로운 타깃으로 삼은 어떤 디지털 멘탈헬스 회사는 사용자에게 '영양소를 고루 갖춘 건강한 식단'을 제시하거나 그렇게 먹지 않으면 몸이 상한다는 교훈을 (비로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무지한 마음'을 교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더 나아가, 사용자가 자신의 불규칙한 식사습관을 촬영해 전송하면 그 영상을 '전문가'에게 전달해 코칭을 요청하고,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단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으면 몸이 상합니다"라는 도덕적 지침을 다시 되돌려주는 식이다.
섭식장애의 본질을 '영양 지식의 부족'이나 잘못된 습관에 대한 '병식(insight) 결핍'으로 즉, 인식적 부정의(epistemic injustice)의 방식으로 단순화해 바라보는 것이다. 농담 같지만, 이것이 한국 디지털 멘탈헬스 업계의 현실이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의료가 개선된다는 믿음은 데이터 신앙에 불과하다. 한국의 DUR(의약품 중복투여 관리시스템) 사례를 보더라도, 경고 시스템이 존재해도 3분 진료의 현실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임상 행태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위고비 처방 과열 사태가 그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 변화를 이루려면, 지불·심사 규칙과 감사 체계, 전문지침과 징계 절차, 그리고 경고 피로를 줄이기 위한 경고 설계 같은 거버넌스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
▲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홍보 포스터 "국민의 바이오 데이터를 모아 미래 의료의 빅데이터를 만듭니다." 개인의 건강·유전체 정보를 수집해 국가 단위 데이터 인프라로 통합하는 정부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사업과 기술적 불가능성
복지부가 추진하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사업(NIBBD)'은 2032년까지 100만 명 규모의 유전체를 포함한 멀티모달 바이오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병원마다 데이터 포맷과 표준이 달라 실제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고, 임상, 영상, 유전체, 오믹스 등 각 데이터의 표준을 맞추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 그럼에도 정부는 "데이터를 모으면 정밀의료가 가능하다"는 낡은 신화를 되풀이한다.
몇 해 전 나는 한 디지털헬스 회사에서 일하며 한 지자체의 치매 데이터 통합 사업을 살필 기회가 있었다. 도시 단위의 치매 레지스트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임상 데이터, MRI 영상, 유전체 데이터까지 한곳에 모아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호가 앞섰다. 하지만 실제로 내부에 뉴로이미징 데이터가 무엇인지, 오믹스 데이터와 어떤 점이 다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일단 데이터를 업로드할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다른 고민은 나중에 하면 된다는 것이, 역시 농담 같지만, 내가 매번 들었던 답이었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EuCanImage, CHAIMELEON, Human Brain Project 같은 해외 프로젝트 문서를 뒤적였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 통합은 단순한 저장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전문지식의 공존과 협업 거버넌스의 문제라는 점이었다.
나는 LORIS, XNAT 같은 뉴로이미징 데이터 관리 플랫폼들을 직접 조사했다. 이 시스템들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가 아니라, 수년간의 표준화, 프로토콜 협약, 메타데이터 설계, 윤리위원회 검토 체계 위에서 겨우 작동하는 복잡한 사회적 인프라였다. 유럽 CHAIMELEON 프로젝트는 아예 각 병원의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옮기지 않고, 병원마다 데이터를 보관한 채 중앙에서 질의만 주고받는 분산형(federated) 구조를 채택했다. 이것이 "통합"의 실제 모습이었다.
해외에도 지금까지 임상·영상·유전체 데이터를 완전 통합한 단일 국가 레지스트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의 Dementias Platform UK, 캐나다의 Brain-CODE, 핀란드의 Findata 모두 데이터 연합형 구조로만 운영되고 있다. 결국 "데이터를 잘 모으면 정밀의료가 실현된다"는 믿음은 과학이라기보다 행정의 언어, 혹은 정치적 상상에 가까운 신화다.
▲ [AWC2022 in Seoul] Hippo AI Foundation 발표 영상 Hippo AI Foundation 설립자가 2022년 서울에서 열린 AWC(AI World Congress)에서 발표한 내용 중 일부. 그는 의료 AI 개발의 공공성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이타주의(Data Altruism)' 개념과 비영리 데이터 위탁신탁(Charitable Data Trust) 모델을 소개하며, 사회·기술·공동체가 교차하는 AI 커먼즈(Data & AI Commons) 비전을 제시했다.
ⓒ The AI TV
2021~22년, 세계적으로 가장 창의적이었던 헬스데이터 논의들
몇 해 전 개인적으로 헬스데이터와 공공 데이터 리포지토리를 둘러싼 전 세계의 지적으로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논의들에 큰 관심을 가졌던 기억이 있다. 그 시기 나는 독일의 비영리단체 Hippo AI Foundation의 설립자 Bart de Witte와 우연히 연결되었고, '의료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고 누가 이익을 얻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일반 시민들이 데이터를 생산해 제공하면 소소하게 용돈벌이는 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가 사방에 눈에 띄던 시절, 마치 극심한 곤궁에 처한 사람이 금니라도 빼서 가용 자금을 만들듯이 개개인 시민의 데이터에 푼돈 수준의 값어치가 매겨지던 상황에서, 나는 베르그루엔 연구소(Berggruen Institute)의 데이터 배당주의(Data Dividends Initiative) (데이터를 노동(labor)로 보고 기여한 개개인에게 배당(dividend)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를 혁신적으로 보았지만 그는 그마저도 "데이터를 '21세기의 석유'로 보는, 시민을 소외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개념"에 속한다고 평했다.
나는 그 대화를 계기로 '데이터 상업화(data commodification)'와 '공공선을 위한 의료 AI(Medical AI for Social Good)'에 대한 글로벌 논의들에 관심이 생겼다. 당시의 탐색 가운데 가장 강렬했던 것은 핀란드의 혁신기금 Sitra가 주도한 유럽연합 공동행동 프로젝트 TEHDAS (Towards the European Health Data Space)였다. TEHDAS는 보건데이터 활용의 철학을 근본적으로 다시 쓴 시도였다. 핵심은 단순했다. 데이터를 산업 경쟁력의 연료로 보지 않고, 시민의 건강과 공공성의 기반으로 다루자는 것이었다.
TEHDAS는 각국의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모으지 않고, 각 기관이 스스로 데이터를 보유한 채 표준화된 규칙으로 연결하는 연합형(federated) 구조를 제안했다. 즉,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후 2024년 3월, 유럽의회는 이를 법제화한 EHDS (European Health Data Space)를 통과시켰다. EHDS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 의료데이터의 1차 활용(진료·돌봄)과 2차 활용(연구·정책·산업)을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각국이 독립적인 보건데이터 허가청(Health Data Access Body, HDAB)을 두어 데이터 접근을 심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보험·신용·마케팅 등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목적의 활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무엇보다 모든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열람할 수 있다.
EHDS는 데이터의 양보다 경계의 명료함을 우선했다. 국가가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먼저 시민이 그 활용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였다.
▲ TEHDAS가 제안한 유럽건강데이터공간(EHDS)의 구조도 각 회원국이 독립적인 데이터 노드(Node)와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Secure Processing Environment, SPE)을 유지한 채, 데이터 허가기관(Data Permit Authority)과 EU 중앙서비스(Centralized Services)를 통해 상호 연결되는 구조를 제시한다. 이 모델은 '데이터의 통합'이 아니라 '데이터가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연합형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 출처: Sitra 및 TEHDAS 컨소시엄, 「Advancing Data Sharing to Improve Health for All in Europe」 (2023), Graphic by Topias Dean et al. https://www.sitra.fi/en/publication/advancing-data-sharing-to-improve-health-for-all-in-europe/
ⓒ Sitra
각국의 제도적 실험들
① 영국영국은 의료데이터를 단일 프레임으로 다루지 않는다. NHS–UK Biobank 모델이 '공공진료와 연구의 경계'를 제도적으로 분리했다면, Federated Data Platform(FDP)은 '데이터의 통제와 투명성'을 기술적으로 재설계하려는 시도였다. 전자는 데이터의 활용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후자는 데이터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다룬다.
NHS와 UK Biobank의 두 층위영국은 공공진료체계(NHS)와 연구 인프라(UK Biobank)를 엄격히 분리했다. NHS의 임상데이터는 진료 목적으로만 쓰이며, 연구자는 UK Biobank를 통해 별도 동의를 거친 데이터에만 접근할 수 있다. UK Biobank의 데이터는 산업체에도 개방되지만, 모든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공공 재투자를 의무화한다.즉, '활용'의 자유보다 '피드백의 의무'가 우선한다. 이 구조가 영국 의료데이터의 신뢰를 지탱한다.
Federated Data Platform(FDP)의 투명성 실험영국 NHS는 2022년, 팔란티어(Palantir)의 기술을 일부 도입해 Federated Data Platform(FDP) 을 구축했다. 그러나 초기에 민간기업 의존과 계약 비공개 논란이 불거지면서, NHS는 'Secure Data Environment(SDE)' 원칙을 제도화했다. 즉, 데이터는 결코 외부로 반출되지 않고, 모든 분석은 NHS가 통제하는 환경 안에서만 수행된다. 이는 "데이터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둬두는 방식으로 신뢰를 확보"하는 새로운 전략이었다.
② 핀란드: Findata와 투명한 허가제핀란드의 Findata는 건강데이터 접근을 허가·감독하는 독립기관이다. 연구자와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Findata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데이터는 외부 반출 없이 보안 환경(Secure Remote Access)에서만 분석할 수 있다. 모든 프로젝트의 목적, 기간, 이용 데이터셋이 Findata의 공개 포털에 기록된다.
핀란드는 또한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 이력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했다. 이 모든 절차는 '데이터 신뢰 체계'를 기술이 아니라 제도와 투명성으로 구축한 사례다.
③ 프랑스: Health Data Hub(HDH)의 이중 심사프랑스의 HDH는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라 감시기관이다. 데이터 활용 신청은 두 단계를 거친다. 먼저 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CESREES, 그다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의 법적 적합성 검토를 통과해야 한다. 허가된 모든 프로젝트는 HDH의 공개 디렉토리에 기록된다.
프랑스는 기술기업보다 공공기관이 '보건데이터의 윤리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④ 미국: 정보차단금지법(Information Blocking)과 TEFCA미국은 방대한 데이터 허브 대신, 의료기관과 IT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거나 폐쇄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Information Blocking 금지 조항을 만들었다. 또한 TEFCA(Trusted Exchange Framework and Common Agreement)를 통해 데이터 교환의 표준과 법적 신뢰 틀을 정비했다. 즉,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는 것"보다 "데이터의 독점을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
⑤덴마크: Sundhed.dk와 '생활 속 의료데이터'
덴마크의 Sundhed.dk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 처방, 예방접종 이력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1차 포털이다. 모든 데이터는 공공의료체계 내부에서 생성·보관되며,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여기에는 복잡한 AI나 빅데이터 분석이 없다. 오히려 일상적인 접근성과 체감 가능한 신뢰가 덴마크 의료데이터 시스템의 핵심이다.
▲ 프랑스 Health Data Hub의 보건데이터 활용 구조 프랑스의 Health Data Hub(HDH)는 국가건강데이터시스템(SNDS)의 일부로, 각 기관의 데이터를 카탈로그화(catalogue storage)하여 중앙서버에 복사 저장한 뒤, 추출 공간(extraction space)과 연구 프로젝트 공간(project space)을 거쳐 승인된 연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는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며, 접근·추출·분석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감독된다. * 출처: Health Data Hub, "Roadmap 2021." https://www.health-data-hub.fr/sites/default/files/2021-07/Roadmap_HDH_2021.pdf
ⓒ Health Data Hub
'통합'보다 '경계'가 신뢰를 만든다
이 다섯 나라의 모델은 각기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된 통찰을 보여준다.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경계의 명료함이 신뢰를 만든다는 점이다.
EU의 EHDS는 법으로 경계를 그었고, 핀란드의 Findata는 접근 허가를 통해, 프랑스의 HDH는 감독과 공개를 통해, 영국 NHS의 FDP는 계약과 보안을 통해, 미국은 명시적 금지 조항을 통해, 덴마크는 체감 품질을 통해 신뢰를 구축했다.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택한 원칙은 단 하나였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자유"보다 "데이터를 다루는 책임"을 우선하는 것. 경계와 통제가 존재해야만 데이터의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인식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이 원리를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직접 관리한다"는 MyData형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제 구조는 국가가 데이터를 중앙집적해 산업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Biobank형 모델에 가깝다. 결국 "국민의 데이터 주권"이라는 수사와 "산업 활성화"라는 목표가 뒤엉켜, 공공성을 산업 논리가 대체하기 쉬운 구조적 약점을 드러낸다.
'가짜 식당'의 AI 로봇이 묻는 질문
인기 예능 프로그램 〈식스센스〉는 제작진이 가짜 상점을 꾸며두고, 출연자들이 매회 서너 곳의 상점 중 '가짜'를 찾아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방영분에서는 AI 로봇이 손님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 메뉴를 추천하는 식당이 '가짜 상점'으로 등장했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실제 판교의 로봇 업체를 찾아가 협조를 구했고, 개발자들은 현재 구현 가능한 기능을 토대로 가상의 메뉴 추천 로봇을 프로그래밍했다. 결과는 이랬다. 인바디 측정치와 얼굴 분석으로 추정한 스트레스 지수가 취합된 뒤, 로봇은 추가적으로 고객에게 이렇게 묻는다.
"혹시 고혈압, 저혈압, 당뇨가 있으신가요?"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너무도 익숙한 장면이라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로봇은 실제로 그 어떤 질병도 감지하지 못하고 결국 손님이 스스로 자신의 병력을 읊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AI가 필요한가? 고객은 이미 자신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처음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손님이 직접 병력을 적게 해도 괜찮았을 것이다. 아니, 사실 평소 조심해야 하는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자신에게 좋은 식단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제작진은 사전에 건강 데이터와 가짜 식당의 코스 메뉴를 나름대로 매칭한 방식이 영양학적으로 합리적인지를 한 영양사에게 자문받는 장면도 보여주는데, 사실 이 작은 식당의 메뉴는 애초에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그 결과 취합된 데이터가 어떻든 A 손님과 B 손님이 먹게 될 음식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시스템에 투입된 지식, 기술, 노력, 시간, 자금을 떠올리면 — 결과는 얼마나 초라한가. 이 식당이 '가짜'였으니 망정이지, 만약 진짜였다면 어떻게 수익을 맞출 수 있을까?
문제는 데이터가 아니다. 방송 속 그 작은 식당과 로봇 회사도 사업성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 불운을 겪게 될 것이다. 하물며, 한 나라의 의료체계는 어떨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보다, 그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 '공공의 구조' 자체가 부재하다면 말이다.
정부가 공언하듯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실제 열리더라도, 그 안에 사람과 제도 그리고 돌봄의 맥락이 없다면 모든 '혁신'은 결국 가짜 식당의 AI 로봇처럼 공허하게 움직이다 머지않아 부끄러운 인프라로만 남을 것이다.
바다이야기 다운로드야마토2체리마스터 다운신천지게임 다운로드
오리지날야마토2게임 ♗ 18.rax781.top ♗ 바다이야기 고래
릴게임 신천지 ♗ 53.rax781.top ♗ 빠징코 슬롯머신
릴게임 체리마스터 ♗ 3.rax781.top ♗ 백경게임 하는곳주소
야마토 2 온라인 게임 ♗ 53.rax781.top ♗ 황금성동영상
알라딘체험머니 무료 슬롯 메타 모바일야마토게임 게임바둑이추천 파칭코게임 황금성 게임 다운로드 바다이야기 pc용 황금성 오리지널 황금성하는곳 파칭코 어플 게임몰 릴게임 바다이야기 apk 슬롯종류 바다이야기 부활 야마토온라인주소 체리마스터 pc용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야마토 릴게임 온라인 슬롯머신 오션파다라이스 다운로드 빠찡코 하는 방법 인터넷황금성 용의눈게임 하이클래스릴게임 최신야마토 무료야마토 다빈치다운로드 야마토 게임방법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바다이야기 꽁머니 환전 야마토창공 릴게임 신천지 무료슬롯체험 모바일파칭코 프라그마틱 슬롯 추천 바다이야기규칙 릴게임다운 오리지널야마토2게임 릴게임손오공하는법 릴게임손오공 게임몰 인터넷야마토릴게임 빠친코게임 슬롯버그 릴게임사이트 프라그마틱 무료체험 야마토게임공략법 무료충전게임 바다이야기 슬롯 파칭코 게임 릴게임야마토 일본빠찡꼬 릴게임오션 없습니다. 바다이야기코드 릴게임 황금성 알라딘온라인릴게임 바다이야기 게임장 바다이야기 파일 우주전함야마토2202 고전릴게임 바다이야기2 바다이야기무료체험 야마토5게임공략법 신천지릴게임 릴게임 먹튀보증 릴짱 오션파라다이스게임하는법 바나나게임 신천지릴게임 스핀모바게임랜드 바다이야기게임다운 모바일파칭코 무료 슬롯 메타 온라인빠찡고 바다이야기게임기 강원랜드 슬롯머신 확률 공개 황금성9 프라그마틱 슬롯 추천 알라딘 게임 다운 슬롯머신 확률 바다이야기 무료 야마토5게임다운로드 777 잭팟 릴황 금성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체험 슬롯머신 종류 야마토5다운로드게임사이트 손오공게임온라인 빠칭코게임 릴게임추천 오션파라다이스 다운로드 빠찡코 하는 방법 모바일릴게임접속하기 무료 야마토 게임 체리 마스터 pc 용 야마토2게임동영상 사이다 릴게임 파칭코하는법 온라인백경게임 릴게임예시 종합릴게임 릴게임동영상 신오션파라다이스 야마토게임공략법 오리 지날황금성 다빈치릴게임다운로드 백경사이트 알라딘릴게임 사이트 바다이야기 5만 야마토2 pc버전 최신릴게임 신천지인터넷게임 황금성 무료머니 바다이야기 도박 릴게임검증 pc야마토게임 알라딘 게임 다운 야마토5다운로드게임사이트 프라그마틱 슬롯 조작 슬롯머신 기계 구입 슬롯버그 키지노릴게임 무료슬롯 릴게임다운 [잠수함토끼콜렉티브]
▲ 2025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 포스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5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열고, 인공지능 기술과 의료데이터가 주도할 산업 변화의 방향을 논의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난 11월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 새희망홀씨대출 금리 한 '빅데이터 포럼'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담당자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22대 국회 내 입법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2023)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2023)이 각각 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하다. 명칭은 '디지털헬스케어법'이지만, 실제 내용은 의료데이터의 수집·연계 기업은행 ·활용 구조에 관한 것이다. 정직하게 말하면 '디지털헬스케어 데이터법'이 더 정확하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발표 자료에는 네 가지 대표 서비스가 등장했다.
(1) 자녀 예방접종 알림,(2) 부모님 건강 모니터링,(3) 검증된 개인 건강정보 기반 진료,(4)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을 통한 약물 오남용·감염 관리.
금리인하 표면적으로는 국민 편익을 위한 첨단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의료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산업적 재활용 구조가 핵심이다.
즉, 의료데이터를 공익이 아닌 산업 활성화 수단으로 삼는 새로운 법률적 틀을 만들려는 시도다.
"Blue Button인가, Biobank인가"
정부 연차휴가규정 가 묘사하는 법안 마련 뒤의 모습은 정부가 사실 어떤 형태의 디지털헬스케어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하고 있는가를 최대한 모호하게 만들어 혼동을 일으킨다.
일견 '내 건강정보를 내가 확인·전송·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미국식 MyData(Blue Button) 모델처럼 들리지만, 행정 구조와 법 조항을 보면 유럽식 Biobank/Reposito 무직당일대출 ry 모델, 즉 국가가 수집한 데이터를 집중 관리하고 2차 활용하는 방식에 가깝다. MyData형은 개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강화하지만, 그만큼 민간 앱과 기업으로 데이터가 이전될 위험이 크다. 반대로 Biobank형은 공공 연구와 정책을 위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국가가 데이터를 통제하고 산업에 재이용할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의 Blue Button Initiative는 연방 보훈처(VA)에서 시작되어, 환자가 웹포털에 로그인한 뒤 실제로 'Blue Button'을 클릭하면 자신의 진료기록, 검사결과, 복약정보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데이터의 주체가 명확히 개인이며, 정부는 환자가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권리의 통로를 제공한다.
▲ 미국 '블루 버튼 이니셔티브'의 웹 게시용 로고 미국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블루 버튼(Blue Button)' 프로젝트는 환자가 자신의 의료정보를 직접 내려받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개인 건강데이터 접근 서비스다.
ⓒ 미국 보훈청
이 권리 기반 구조는 이후 FHIR API(국제 표준화된 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와 결합되며 민간 앱 생태계로 확산되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환자가 단 한 번의 '동의'만 하면, 의료데이터는 HIPAA(미국 의료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벗어나 민간 앱으로 이전될 수 있었다.
이 환경 속에서 Ciitizen, Apple Health, PicnicHealth 같은 기업들이 등장했다. 특히 Ciitizen은 창립자가 희귀질환으로 여동생을 잃은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개인적 동기에서 출발했다. 이 회사는 환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대신 환자가 동의한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임상시험 기업과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냈다. 실제로 Ciitizen(이후 유전체 기업 Invitae에 합병됨)은 환자 대신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하고, 이를 표준화된 전자 형식으로 정리해 개인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환자는 앱을 통해 자신의 데이터를 내려받거나 다른 병원에 전송할 수 있었고, Ciitizen은 이 과정을 대신 처리해주는 일종의 데이터 대리인으로 작동했다.
▲ Ciitizen의 설립 계기를 설명하는 슬라이드 "데이터에 목적을 부여하다" ? 애플에 인수된 의료데이터 스타트업 Gliimpse의 창업자였던 아닐 세스(Anil Sethi)는, 전이성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여동생 타니아를 기리기 위해 Ciitizen을 설립했다. * 출처: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501134/000119312521266044/d212880dex992.htm
ⓒ Invitae
▲ 과거 Ciitizen의 서비스 페이지 사용자는 병원별 진단 보고서, 조직검사 결과, 치료 이력 등 자신의 의료기록을 한눈에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사진은 타니아 세스의 유방암 조직검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실제 데이터 예시 화면. * 출처: https://www.outofpocket.health/p/ciitizen-and-the-patient-data-marketplace
ⓒ Out Of Pocket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데이터 마켓플레이스(health data marketplace)'라 불리는 새로운 데이터 브로커 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했다. Blue Button 정책과 FHIR 기반 API를 통해 확보된 환자 데이터가 병원, 보험사, 연구기관, 제약·바이오 기업 사이에서 거래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Datavant, TriNetX, HealthVerity 같은 플랫폼이다. 이들은 의료기관과 기업을 연결해 "표준화된 환자 데이터 세트"를 사고팔며, 제약사와 바이오테크 기업은 이를 분석해 임상시험 설계나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했다.
결국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열린 통로가 곧 '데이터 상업화'를 위한 시장으로 재편된 셈이다.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 데이터는 다시 시장을 순환하며 기업의 자산이 되어갔다.
한국의 디지털헬스케어법 역시 같은 구조를 품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전송요구권'을 개인에게 부여하지만, 동시에 '활용 전문기관'을 지정해 산업과 연구에 데이터를 개방할 근거를 만든다. 결국 지금은 공공 MyData 플랫폼(MyHealthway)이지만, 향후 API가 민간에 개방되면 한국판 유료 데이터 플랫폼이 출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AI 기반 건강 리포트", "개인 맞춤형 처방 추천", "예측형 건강지수" 같은 서비스를 내세워 개인 데이터를 분석·가공·판매하는 산업이 등장할 것이다. 이는 공공 인프라를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가 다시 시장의 상품으로 되돌아오는 구조다.
그러나 또 한편, 데이터의 양이 많다고 의료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임상적 근거 없이 "AI 기반 인사이트"를 내세우는 기업들은 이미 급증하고 있다. 요즘 쏟아져 나오는 디지털 멘탈헬스 앱들만 봐도 그렇다. 그들은 스마트폰 센서나 웨어러블 기기로 얻을 수 있는 피상적이고 산발적인 생체 데이터를, 가령 '우울'이나 '불안' 같은 복잡한 심리적 구성개념(construct)과 근거 없이 동일시한다. 그 위에 "AI 마음건강 관리" 같은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객관성과 과학성을 가장한 기만적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이런 환상은 결국 시장의 환멸을 불러오고, 마침내는 유일하게 남은 현실적인 사업모델인 보험료 차등, 위험군 선별, 소비자 등급화 같은 차별적 수익화 모델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반면, 유럽의 Biobank형 모델은 데이터를 공공 연구와 정책 목적으로 수집·보관하고 개인의 직접 통제보다는 제도적 통제를 중시한다. 복지부의 담론은 이 두 모델 사이를 끊임없이 왕복한다. 공식 자료에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문장과 "국가가 데이터를 통합해 산업과 연구에 활용한다"는 문장이 나란히 있다. 결국 데이터의 소유 주체가 국민인지 국가인지 불분명하다.
이는 국민에게는 '내 건강정보 보기'라는 권리의 언어를, 산업계에는 '데이터 개방과 활용'이라는 성장 언어를 동시에 전달하려는 전략적 양면성에서 비롯된 모호함일 것이다.
▲ 건강정보 고속도로: '환자 중심'으로 포장된 데이터 유통 인프라 '고속도로'라는 이름은 데이터 이동의 효율을 포장하지만, 그 위에서 누가 운전하고, 누가 요금을 받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 보건복지부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상의 기술적 한계
보건복지부가 슬라이드에서 제시한 "전국민 건강정보 고속도로(MyHealthway)"는 새로운 구상이 아니다. 이 사업은 이미 2021년부터 구축이 시작되어, 2024년 현재 모바일 앱 '나의건강기록'과 웹 포털(MyHealthway.go.kr)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은 금융인증서나 PASS 인증으로 로그인해① 공공기관 보유 정보(진료·투약·검진·예방접종 이력 등)와② 일부 참여 의료기관의 EMR 데이터를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또한 걸음수·혈압·혈당 등 개인 건강기기나 스마트폰 헬스앱(삼성헬스·애플헬스) 데이터도 연동 가능하다. 사용자는 이 데이터를 PDF로 저장하거나, 일시적 QR코드를 발급해 의료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의료기관 측은 환자가 앱에서 공유한 데이터를 웹뷰어나 EMR 내 '나의건강기록' 모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일부 시범병원에서만 작동하며, 열람 시간도 보안상 30분으로 제한된다. 현재까지는 환자 → 병원으로의 단방향 공유(PHR, Personal Health Record) 구조이며, 전국 병·의원 간의 실시간 연계나 예약 시스템 통합은 구현되어 있지 않다.
즉, 현재의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시민 개인의 데이터 열람·공유" 단계까지는 작동 중이지만,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전국 실시간 통합"이나 "AI 기반 의료연계 서비스"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 여러 병원의 진료 일정을 하나의 창구에서 예약하는 이탈리아 'CUP' 모델. 병원·전화·무인 단말 등 다양한 창구에서 예약 정보를 입력하면, 중앙화된 백오피스가 여러 병원의 진료 일정을 통합 관리한다. * 출처: https://kaizen.com/it/insights-it/migliorare-punto-nevralgico-servizio-sanitario/
ⓒ Kaizen Institute
<뚜벅뚜벅 이탈리아 공공의료: 피에몬테 에밀리아로마냐 의료견문록>(또하나의문화, 2019)에 문정주 선생이 기록한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보면 이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그곳에서는 시민이 가까운 우체국이나 은행 창구에 가서 대기가 가장 적은 병원을 예약할 수 있다. 이는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가 통합돼 있고, 예약·대기·검사 데이터가 표준화돼 실시간으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볼로냐·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은 1990년부터 30여 년에 걸쳐 CUP(Centro Unico di Prenotazione, 단일예약센터)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CUP은 지역 내 공공병원과 보건소, 약국, 콜센터, 웹포털을 하나의 예약 네트워크로 엮은 시스템이다.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거버넌스와 표준화였다. 우선 각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항목과 검사코드를 하나의 서비스 카탈로그로 통일하고, 예약·대기·결제 프로세스를 지역 표준으로 정비했다. 시민은 온라인, 병원 창구, 콜센터, 약국('FarmaCUP') 등 어느 채널을 이용하더라도 같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통합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지방보건국(ASL) 단위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지역 수준으로 확장되었고, 그 후에야 국가 차원의 대기열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연계됐다. 즉, 점진적이고 협의적인 확장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그럼에도 CUP은 여전히 모든 병원을 포괄하지 않는다. 주로 공공의료 네트워크 중심으로만 작동하며, 영상·유전체처럼 복잡한 데이터는 '예약' 기능 범위 밖에 있다.
즉, 현재의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전국 통합 EMR 네트워크가 아니라, 공공데이터와 일부 병원 정보를 개인 앱을 통해 확인·공유할 수 있는 제한적 플랫폼이다.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그 위에 "전국민 건강정보 고속도로"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덧씌우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MyHealthway의 기능을 '혁신'으로 재포장하는 셈이다.
한국이 이탈리아 같은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최소한 다섯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국가 차원의 서비스 카탈로그 표준, 둘째, 의료 제공자 디렉토리 구축, 셋째, 모든 EMR에 적용 가능한 강제 기술규격, 넷째, 이를 감독하고 유지할 전담 조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계적 지역 시범사업이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인천공항 한 곳에서 전 세계 항공사의 운항과 예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전국 통합 실시간 예약"을 말하는 것은, 기술적 현실을 무시한 행정적 선언에 가깝다.
법안 구조상, 민간 병원은 제외
안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2024.10.31)에 따르면, 데이터 제공 의무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복지부가 지정한 일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한정된다.
즉, 대다수 민간 병·의원은 데이터 개방 의무가 없다. 결국 정부는 "산업 진흥"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되, 실제 제공 의무와 책임은 공공기관과 국립대병원에 떠넘긴다. 공공은 책임만, 민간은 이익만 갖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예방접종 알림"은 이미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NIP)'은 이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서비스는 기존 기능의 재포장에 불과하다. 이런 반복은 단순한 행정 중복이 아니라, 디지털헬스케어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가능한 기능을 '혁신'처럼 포장하는 관료적 언어의 전략을 보여준다.
"부모님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의 돌봄 공백
복지부가 내세운 '부모님 건강상태 실시간 알림'은 기술적으로 가능해 보이지만, 그다음 단계 (위험 알림 이후의 돌봄과 대응)의 책임 구조가 없다. 공공의 간호 인프라나 커뮤니티 케어 체계 없이 가족에게 알림만 보내는 시스템은,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 전가하는 기술적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데이터만으로 환자 안전이 보장되진 않는다
'검증된 개인 건강정보 기반 진료'와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을 통한 약물 오남용·감염 관리'는 모두 어떤 건강·의료 문제를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효한 정보 결여', 혹은 '당사자의 무지'에 귀인하는 여러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회사들과 너무나 꼭같은 시각을 드러낸다. 즉, 권위 있는 전문 지식 혹은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제공하면 오판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사고방식이다.
가령, 섭식장애를 흥미로운 타깃으로 삼은 어떤 디지털 멘탈헬스 회사는 사용자에게 '영양소를 고루 갖춘 건강한 식단'을 제시하거나 그렇게 먹지 않으면 몸이 상한다는 교훈을 (비로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무지한 마음'을 교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더 나아가, 사용자가 자신의 불규칙한 식사습관을 촬영해 전송하면 그 영상을 '전문가'에게 전달해 코칭을 요청하고,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단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으면 몸이 상합니다"라는 도덕적 지침을 다시 되돌려주는 식이다.
섭식장애의 본질을 '영양 지식의 부족'이나 잘못된 습관에 대한 '병식(insight) 결핍'으로 즉, 인식적 부정의(epistemic injustice)의 방식으로 단순화해 바라보는 것이다. 농담 같지만, 이것이 한국 디지털 멘탈헬스 업계의 현실이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의료가 개선된다는 믿음은 데이터 신앙에 불과하다. 한국의 DUR(의약품 중복투여 관리시스템) 사례를 보더라도, 경고 시스템이 존재해도 3분 진료의 현실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임상 행태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위고비 처방 과열 사태가 그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 변화를 이루려면, 지불·심사 규칙과 감사 체계, 전문지침과 징계 절차, 그리고 경고 피로를 줄이기 위한 경고 설계 같은 거버넌스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
▲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홍보 포스터 "국민의 바이오 데이터를 모아 미래 의료의 빅데이터를 만듭니다." 개인의 건강·유전체 정보를 수집해 국가 단위 데이터 인프라로 통합하는 정부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사업과 기술적 불가능성
복지부가 추진하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사업(NIBBD)'은 2032년까지 100만 명 규모의 유전체를 포함한 멀티모달 바이오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병원마다 데이터 포맷과 표준이 달라 실제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고, 임상, 영상, 유전체, 오믹스 등 각 데이터의 표준을 맞추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 그럼에도 정부는 "데이터를 모으면 정밀의료가 가능하다"는 낡은 신화를 되풀이한다.
몇 해 전 나는 한 디지털헬스 회사에서 일하며 한 지자체의 치매 데이터 통합 사업을 살필 기회가 있었다. 도시 단위의 치매 레지스트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임상 데이터, MRI 영상, 유전체 데이터까지 한곳에 모아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호가 앞섰다. 하지만 실제로 내부에 뉴로이미징 데이터가 무엇인지, 오믹스 데이터와 어떤 점이 다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일단 데이터를 업로드할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다른 고민은 나중에 하면 된다는 것이, 역시 농담 같지만, 내가 매번 들었던 답이었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EuCanImage, CHAIMELEON, Human Brain Project 같은 해외 프로젝트 문서를 뒤적였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 통합은 단순한 저장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전문지식의 공존과 협업 거버넌스의 문제라는 점이었다.
나는 LORIS, XNAT 같은 뉴로이미징 데이터 관리 플랫폼들을 직접 조사했다. 이 시스템들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가 아니라, 수년간의 표준화, 프로토콜 협약, 메타데이터 설계, 윤리위원회 검토 체계 위에서 겨우 작동하는 복잡한 사회적 인프라였다. 유럽 CHAIMELEON 프로젝트는 아예 각 병원의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옮기지 않고, 병원마다 데이터를 보관한 채 중앙에서 질의만 주고받는 분산형(federated) 구조를 채택했다. 이것이 "통합"의 실제 모습이었다.
해외에도 지금까지 임상·영상·유전체 데이터를 완전 통합한 단일 국가 레지스트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의 Dementias Platform UK, 캐나다의 Brain-CODE, 핀란드의 Findata 모두 데이터 연합형 구조로만 운영되고 있다. 결국 "데이터를 잘 모으면 정밀의료가 실현된다"는 믿음은 과학이라기보다 행정의 언어, 혹은 정치적 상상에 가까운 신화다.
▲ [AWC2022 in Seoul] Hippo AI Foundation 발표 영상 Hippo AI Foundation 설립자가 2022년 서울에서 열린 AWC(AI World Congress)에서 발표한 내용 중 일부. 그는 의료 AI 개발의 공공성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이타주의(Data Altruism)' 개념과 비영리 데이터 위탁신탁(Charitable Data Trust) 모델을 소개하며, 사회·기술·공동체가 교차하는 AI 커먼즈(Data & AI Commons) 비전을 제시했다.
ⓒ The AI TV
2021~22년, 세계적으로 가장 창의적이었던 헬스데이터 논의들
몇 해 전 개인적으로 헬스데이터와 공공 데이터 리포지토리를 둘러싼 전 세계의 지적으로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논의들에 큰 관심을 가졌던 기억이 있다. 그 시기 나는 독일의 비영리단체 Hippo AI Foundation의 설립자 Bart de Witte와 우연히 연결되었고, '의료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고 누가 이익을 얻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일반 시민들이 데이터를 생산해 제공하면 소소하게 용돈벌이는 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가 사방에 눈에 띄던 시절, 마치 극심한 곤궁에 처한 사람이 금니라도 빼서 가용 자금을 만들듯이 개개인 시민의 데이터에 푼돈 수준의 값어치가 매겨지던 상황에서, 나는 베르그루엔 연구소(Berggruen Institute)의 데이터 배당주의(Data Dividends Initiative) (데이터를 노동(labor)로 보고 기여한 개개인에게 배당(dividend)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를 혁신적으로 보았지만 그는 그마저도 "데이터를 '21세기의 석유'로 보는, 시민을 소외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개념"에 속한다고 평했다.
나는 그 대화를 계기로 '데이터 상업화(data commodification)'와 '공공선을 위한 의료 AI(Medical AI for Social Good)'에 대한 글로벌 논의들에 관심이 생겼다. 당시의 탐색 가운데 가장 강렬했던 것은 핀란드의 혁신기금 Sitra가 주도한 유럽연합 공동행동 프로젝트 TEHDAS (Towards the European Health Data Space)였다. TEHDAS는 보건데이터 활용의 철학을 근본적으로 다시 쓴 시도였다. 핵심은 단순했다. 데이터를 산업 경쟁력의 연료로 보지 않고, 시민의 건강과 공공성의 기반으로 다루자는 것이었다.
TEHDAS는 각국의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모으지 않고, 각 기관이 스스로 데이터를 보유한 채 표준화된 규칙으로 연결하는 연합형(federated) 구조를 제안했다. 즉,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후 2024년 3월, 유럽의회는 이를 법제화한 EHDS (European Health Data Space)를 통과시켰다. EHDS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 의료데이터의 1차 활용(진료·돌봄)과 2차 활용(연구·정책·산업)을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각국이 독립적인 보건데이터 허가청(Health Data Access Body, HDAB)을 두어 데이터 접근을 심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보험·신용·마케팅 등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목적의 활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무엇보다 모든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열람할 수 있다.
EHDS는 데이터의 양보다 경계의 명료함을 우선했다. 국가가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먼저 시민이 그 활용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였다.
▲ TEHDAS가 제안한 유럽건강데이터공간(EHDS)의 구조도 각 회원국이 독립적인 데이터 노드(Node)와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Secure Processing Environment, SPE)을 유지한 채, 데이터 허가기관(Data Permit Authority)과 EU 중앙서비스(Centralized Services)를 통해 상호 연결되는 구조를 제시한다. 이 모델은 '데이터의 통합'이 아니라 '데이터가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연합형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 출처: Sitra 및 TEHDAS 컨소시엄, 「Advancing Data Sharing to Improve Health for All in Europe」 (2023), Graphic by Topias Dean et al. https://www.sitra.fi/en/publication/advancing-data-sharing-to-improve-health-for-all-in-europe/
ⓒ Sitra
각국의 제도적 실험들
① 영국영국은 의료데이터를 단일 프레임으로 다루지 않는다. NHS–UK Biobank 모델이 '공공진료와 연구의 경계'를 제도적으로 분리했다면, Federated Data Platform(FDP)은 '데이터의 통제와 투명성'을 기술적으로 재설계하려는 시도였다. 전자는 데이터의 활용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후자는 데이터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다룬다.
NHS와 UK Biobank의 두 층위영국은 공공진료체계(NHS)와 연구 인프라(UK Biobank)를 엄격히 분리했다. NHS의 임상데이터는 진료 목적으로만 쓰이며, 연구자는 UK Biobank를 통해 별도 동의를 거친 데이터에만 접근할 수 있다. UK Biobank의 데이터는 산업체에도 개방되지만, 모든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공공 재투자를 의무화한다.즉, '활용'의 자유보다 '피드백의 의무'가 우선한다. 이 구조가 영국 의료데이터의 신뢰를 지탱한다.
Federated Data Platform(FDP)의 투명성 실험영국 NHS는 2022년, 팔란티어(Palantir)의 기술을 일부 도입해 Federated Data Platform(FDP) 을 구축했다. 그러나 초기에 민간기업 의존과 계약 비공개 논란이 불거지면서, NHS는 'Secure Data Environment(SDE)' 원칙을 제도화했다. 즉, 데이터는 결코 외부로 반출되지 않고, 모든 분석은 NHS가 통제하는 환경 안에서만 수행된다. 이는 "데이터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둬두는 방식으로 신뢰를 확보"하는 새로운 전략이었다.
② 핀란드: Findata와 투명한 허가제핀란드의 Findata는 건강데이터 접근을 허가·감독하는 독립기관이다. 연구자와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Findata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데이터는 외부 반출 없이 보안 환경(Secure Remote Access)에서만 분석할 수 있다. 모든 프로젝트의 목적, 기간, 이용 데이터셋이 Findata의 공개 포털에 기록된다.
핀란드는 또한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 이력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했다. 이 모든 절차는 '데이터 신뢰 체계'를 기술이 아니라 제도와 투명성으로 구축한 사례다.
③ 프랑스: Health Data Hub(HDH)의 이중 심사프랑스의 HDH는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라 감시기관이다. 데이터 활용 신청은 두 단계를 거친다. 먼저 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CESREES, 그다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의 법적 적합성 검토를 통과해야 한다. 허가된 모든 프로젝트는 HDH의 공개 디렉토리에 기록된다.
프랑스는 기술기업보다 공공기관이 '보건데이터의 윤리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④ 미국: 정보차단금지법(Information Blocking)과 TEFCA미국은 방대한 데이터 허브 대신, 의료기관과 IT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거나 폐쇄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Information Blocking 금지 조항을 만들었다. 또한 TEFCA(Trusted Exchange Framework and Common Agreement)를 통해 데이터 교환의 표준과 법적 신뢰 틀을 정비했다. 즉,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는 것"보다 "데이터의 독점을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
⑤덴마크: Sundhed.dk와 '생활 속 의료데이터'
덴마크의 Sundhed.dk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 처방, 예방접종 이력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1차 포털이다. 모든 데이터는 공공의료체계 내부에서 생성·보관되며,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여기에는 복잡한 AI나 빅데이터 분석이 없다. 오히려 일상적인 접근성과 체감 가능한 신뢰가 덴마크 의료데이터 시스템의 핵심이다.
▲ 프랑스 Health Data Hub의 보건데이터 활용 구조 프랑스의 Health Data Hub(HDH)는 국가건강데이터시스템(SNDS)의 일부로, 각 기관의 데이터를 카탈로그화(catalogue storage)하여 중앙서버에 복사 저장한 뒤, 추출 공간(extraction space)과 연구 프로젝트 공간(project space)을 거쳐 승인된 연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는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며, 접근·추출·분석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감독된다. * 출처: Health Data Hub, "Roadmap 2021." https://www.health-data-hub.fr/sites/default/files/2021-07/Roadmap_HDH_2021.pdf
ⓒ Health Data Hub
'통합'보다 '경계'가 신뢰를 만든다
이 다섯 나라의 모델은 각기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된 통찰을 보여준다.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경계의 명료함이 신뢰를 만든다는 점이다.
EU의 EHDS는 법으로 경계를 그었고, 핀란드의 Findata는 접근 허가를 통해, 프랑스의 HDH는 감독과 공개를 통해, 영국 NHS의 FDP는 계약과 보안을 통해, 미국은 명시적 금지 조항을 통해, 덴마크는 체감 품질을 통해 신뢰를 구축했다.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택한 원칙은 단 하나였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자유"보다 "데이터를 다루는 책임"을 우선하는 것. 경계와 통제가 존재해야만 데이터의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인식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이 원리를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직접 관리한다"는 MyData형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제 구조는 국가가 데이터를 중앙집적해 산업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Biobank형 모델에 가깝다. 결국 "국민의 데이터 주권"이라는 수사와 "산업 활성화"라는 목표가 뒤엉켜, 공공성을 산업 논리가 대체하기 쉬운 구조적 약점을 드러낸다.
'가짜 식당'의 AI 로봇이 묻는 질문
인기 예능 프로그램 〈식스센스〉는 제작진이 가짜 상점을 꾸며두고, 출연자들이 매회 서너 곳의 상점 중 '가짜'를 찾아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방영분에서는 AI 로봇이 손님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 메뉴를 추천하는 식당이 '가짜 상점'으로 등장했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실제 판교의 로봇 업체를 찾아가 협조를 구했고, 개발자들은 현재 구현 가능한 기능을 토대로 가상의 메뉴 추천 로봇을 프로그래밍했다. 결과는 이랬다. 인바디 측정치와 얼굴 분석으로 추정한 스트레스 지수가 취합된 뒤, 로봇은 추가적으로 고객에게 이렇게 묻는다.
"혹시 고혈압, 저혈압, 당뇨가 있으신가요?"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너무도 익숙한 장면이라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로봇은 실제로 그 어떤 질병도 감지하지 못하고 결국 손님이 스스로 자신의 병력을 읊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AI가 필요한가? 고객은 이미 자신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처음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손님이 직접 병력을 적게 해도 괜찮았을 것이다. 아니, 사실 평소 조심해야 하는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자신에게 좋은 식단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제작진은 사전에 건강 데이터와 가짜 식당의 코스 메뉴를 나름대로 매칭한 방식이 영양학적으로 합리적인지를 한 영양사에게 자문받는 장면도 보여주는데, 사실 이 작은 식당의 메뉴는 애초에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그 결과 취합된 데이터가 어떻든 A 손님과 B 손님이 먹게 될 음식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시스템에 투입된 지식, 기술, 노력, 시간, 자금을 떠올리면 — 결과는 얼마나 초라한가. 이 식당이 '가짜'였으니 망정이지, 만약 진짜였다면 어떻게 수익을 맞출 수 있을까?
문제는 데이터가 아니다. 방송 속 그 작은 식당과 로봇 회사도 사업성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 불운을 겪게 될 것이다. 하물며, 한 나라의 의료체계는 어떨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보다, 그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 '공공의 구조' 자체가 부재하다면 말이다.
정부가 공언하듯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실제 열리더라도, 그 안에 사람과 제도 그리고 돌봄의 맥락이 없다면 모든 '혁신'은 결국 가짜 식당의 AI 로봇처럼 공허하게 움직이다 머지않아 부끄러운 인프라로만 남을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