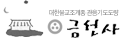릴게임 손오공 ╉ 해물어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훈설래 작성일25-09-16 04:52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15.rpa216.top
1회 연결
http://15.rpa216.top
1회 연결
-
 http://4.ruk737.top
1회 연결
http://4.ruk737.top
1회 연결
본문
최신릴게임 ╉ 신천지게임랜드 ╉㎳ 21.rgu145.top ×검은색은 예로부터 현색(玄色), 흑색(黑色,) 오색(烏色) 등으로 불리면서 ‘만물을 품은 빛깔’로 여겨졌다. 호림박물관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빛과 모양의 흑자를 만나 볼 수 있다.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물빛 흐르는 청자에 검은 학이 날갯짓하고 있다. 옛사람들은 “학이 1000년을 살면 청학(靑鶴·푸른 학)이 되고, 2000년이 지나면 현학(玄鶴·검은 학)이 된다”고 믿었다. 하늘에 현학이 나타나는 날, 태평성세가 온다고도 했다.
이러한 소망이 담긴 12∼13세기 고려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이 서울 강남구 호림박물관 특별전 ‘검은빛의 서사’에서 2일부터 관객들을 만나고 사업대출 있다. 이 매병이 일반에 공개되는 건 처음으로, 간송미술관 소장작(국보)과는 다른 작품이다.
이번 특별전은 그간 고미술에서 흰색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검은색’의 다양한 의미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죽음과 두려움의 색을 넘어 현묘(玄妙)함과 권위, 생명의 근원을 상징했던 검은색과 관련된 회화와 의복, 도자 등 12 서울보증보험연체자 0여 점을 전시했다.
총 3부로 구성된 전시는 옛 문헌을 토대로 검은색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天地玄黃)는 구절로 시작하는 17세기 ‘천자문’, 18세기 조선 문신인 연암(燕巖) 박지원(1737∼1805)의 시와 산문을 엮은 ‘연암집’ 등이 각 도입부에 전시됐다. 연암은 까마귀를 가리켜 “홀연 유금(乳金)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연장 빛이 번지기도 하고 다시 석록(石綠) 빛을 반짝이기도 한다”면서 검정이 수많은 색을 품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기도 했다.
조선 문무백관이 입던 예복 ‘흑단령(黑團領)’은 당대 검은색이 권력을 상징했음을 보여 준다. 검은 옷, 흑칠한 가구 등은 왕실과 사대부만 사용할 수 있었다. 오혜연 학예연구사는 “당시 직물, 나무 등을 까맣게 염색하는 개인파산조건 데엔 품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서민들은 흰색에 비해 값비싼 검은 옷을 구하기 힘들었을뿐더러 절제와 검소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이 이를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의 화승인 신겸이 1790년에 그린 ‘관음보살도’. 호림박물관 제공
쓰리룸
검은 바탕에 금선으로 그려진 ‘아미타설법도’는 1824년 화승 체균(體均) 등이 아미타불(중생을 구원하는 부처)을 그린 불화. 대구 파계사 소장품을 대여했다. 오 연구사는 “국내에서 확인된 흑지선묘불화(黑紙線描佛畵) 10여 점 중 하나”라며 “그림 주위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빛나는 금선이 신성성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고 했다.
전시 후반부 오묘한 빛을 내는 흑자(黑磁·검은 도자류) 20여 개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공간도 눈길을 끈다. 흑자는 유약에 담긴 산화철, 산화티타늄 함유량에 따라 은은한 노란빛이나 푸른빛 등을 띠게 된다. 고려시대부터 일상에서 저장을 위해 쓰는 용기였다. 유지원 학예연구사는 “비교적 일률적으로 색을 낼 수 있었던 백자와 달리, 흑자는 색깔을 통일하기가 어려웠기에 더 다채로운 빛깔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전시장 곳곳에선 근현대 작가들이 검은색을 테마로 창작한 회화와 조각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한자에 담긴 이미지를 3차원으로 형상화한 최만린(1935∼2020)의 ‘천지현황’ 시리즈, 김기린(1936∼2021)의 그림 ‘안과 밖’ 등이다. 11월 29일까지.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물빛 흐르는 청자에 검은 학이 날갯짓하고 있다. 옛사람들은 “학이 1000년을 살면 청학(靑鶴·푸른 학)이 되고, 2000년이 지나면 현학(玄鶴·검은 학)이 된다”고 믿었다. 하늘에 현학이 나타나는 날, 태평성세가 온다고도 했다.
이러한 소망이 담긴 12∼13세기 고려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이 서울 강남구 호림박물관 특별전 ‘검은빛의 서사’에서 2일부터 관객들을 만나고 사업대출 있다. 이 매병이 일반에 공개되는 건 처음으로, 간송미술관 소장작(국보)과는 다른 작품이다.
이번 특별전은 그간 고미술에서 흰색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검은색’의 다양한 의미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죽음과 두려움의 색을 넘어 현묘(玄妙)함과 권위, 생명의 근원을 상징했던 검은색과 관련된 회화와 의복, 도자 등 12 서울보증보험연체자 0여 점을 전시했다.
총 3부로 구성된 전시는 옛 문헌을 토대로 검은색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天地玄黃)는 구절로 시작하는 17세기 ‘천자문’, 18세기 조선 문신인 연암(燕巖) 박지원(1737∼1805)의 시와 산문을 엮은 ‘연암집’ 등이 각 도입부에 전시됐다. 연암은 까마귀를 가리켜 “홀연 유금(乳金)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연장 빛이 번지기도 하고 다시 석록(石綠) 빛을 반짝이기도 한다”면서 검정이 수많은 색을 품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기도 했다.
조선 문무백관이 입던 예복 ‘흑단령(黑團領)’은 당대 검은색이 권력을 상징했음을 보여 준다. 검은 옷, 흑칠한 가구 등은 왕실과 사대부만 사용할 수 있었다. 오혜연 학예연구사는 “당시 직물, 나무 등을 까맣게 염색하는 개인파산조건 데엔 품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서민들은 흰색에 비해 값비싼 검은 옷을 구하기 힘들었을뿐더러 절제와 검소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이 이를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의 화승인 신겸이 1790년에 그린 ‘관음보살도’. 호림박물관 제공
쓰리룸
검은 바탕에 금선으로 그려진 ‘아미타설법도’는 1824년 화승 체균(體均) 등이 아미타불(중생을 구원하는 부처)을 그린 불화. 대구 파계사 소장품을 대여했다. 오 연구사는 “국내에서 확인된 흑지선묘불화(黑紙線描佛畵) 10여 점 중 하나”라며 “그림 주위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빛나는 금선이 신성성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고 했다.
전시 후반부 오묘한 빛을 내는 흑자(黑磁·검은 도자류) 20여 개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공간도 눈길을 끈다. 흑자는 유약에 담긴 산화철, 산화티타늄 함유량에 따라 은은한 노란빛이나 푸른빛 등을 띠게 된다. 고려시대부터 일상에서 저장을 위해 쓰는 용기였다. 유지원 학예연구사는 “비교적 일률적으로 색을 낼 수 있었던 백자와 달리, 흑자는 색깔을 통일하기가 어려웠기에 더 다채로운 빛깔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전시장 곳곳에선 근현대 작가들이 검은색을 테마로 창작한 회화와 조각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한자에 담긴 이미지를 3차원으로 형상화한 최만린(1935∼2020)의 ‘천지현황’ 시리즈, 김기린(1936∼2021)의 그림 ‘안과 밖’ 등이다. 11월 29일까지.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